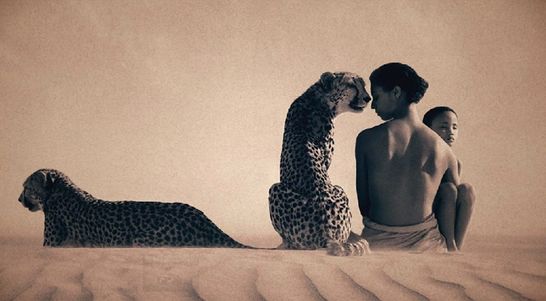[스크랩] 지상의 하루 외 / 임보 시집 木馬日記에서
지상의 하루 / 임보
우리가 여기 오기 위해
몇 억만 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가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기 위해
몇 억만의 우리 조상들 몸을 빌어
그렇게 숨어 흘러내려 왔는가
아 우리가 바로 이런 우리이기 위해
이 손과 발
이 가슴과 머리
바로 이러한 우리이기 위해
끝도 없는 저 우주로부터
무량의 빛과 구름을 모아
이 육신을 그렇게 빚었거니
오늘의 이 청명한 지상의 일기
산과 바다 저 찬란한 자연의 풍광
천둥과 바람 저 감미로운 자연의 운율
이보다 더 고운 낙원이 어디 또 있겠는가
천국을 팔아 지상을 더럽히는 어리석은 자들아
혹 그대 오늘의 삶이 그렇게 고되고 괴로움은
그대의 헛된 욕망과 미망 때문일 뿐
눈부신 이 지상의 하루
몇 억만 년만의 황홀이거니
깨어있는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면
그대의 집 뜰이 낙원의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음을
비로소 눈물겹게 맞게 되리니
설령 그렇다면 말이시 / 임보
한 십만원쯤
내가 그저 써도 좋을 그런
돈이 있다면 말이시
어떻게 할까,
평생 그림 한 점도 못 팔고
욕쟁이로 늙어만 간
설미(雪眉) 화백이나
잘생긴 천상병(千祥炳) 시인쯤 불러
광나루 어느께로 몰려가서
메기탕에 소주를 섞다가
그래도 몇 푼 남으면
목이 곧은 창부(唱婦) 두엇 골라
굿거리 장단으로
배를 띄워도 보고,
한 백만원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생기면 말이시
신혼여행도 못해 보고
불혹(不惑)에 이미 초로(初老)한
내 아내를 이끌고
수안보쯤 가서 며칠 바람을 쐬다가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나는 슬그머니 뒷차로 빠져
점촌(店村) 새재로나 넘어
맘에 드는 산암(山庵)이라도 만나면
문득 들러 한 보름쯤
법고(法鼓)에 젖어도 보고,
한 천만원쯤
써야 할 그런 돈이
어떻게 생긴다면 말이시
어디로 갈까?
우선 남미(南美) 페루의 고원(高原)쯤으로
훌쩍 날아가서
잉카의 더운 돌에 귀도 대 보다가
아마존을 거슬러
밀림 속으로 한 두어 달 오른 뒤,
심심하면
빛깔 고운 추장(酋長)의 딸 하나 얻어
그 시린 눈동자나 들여다보면서
퉁소도 불어 보고,
한 일억원쯤
내가 써야만 하는 그런 돈이,
내 평생의 월급을 다 모아도
만들기 힘든 그런 돈이 생긴다면 말이시,
친구여,
나는 그 돈보따리를 한 이레쯤 베고
잠을 자면서 궁리하겠지
그러다가 또 한 이레쯤
뜬 눈으로 만져만 보다가
내 작은 봇장에는 담을 수 없어
미국의 어느 우주항공국 여행과에
기탁했다가,
보통 사람도 인공위성을 탈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오거든
나도 보고 싶네
천공(天空)에 떠 있는 작은 이 지상(地上)을,
허나, 친구여,
내 주머니는 항상
내가 가볍게 쓸 수 있는 것으로
겨우
골뱅이에 소주 몇 홉,
더러는
그 맑은 유리잔 속에
천공(天空)의 별들도 들어앉고,
아마존의 바람도 일렁이고,
아내의 부푼 손,
도란도란 친구들의 추운 詩도
울어 예는데……
* 이 글을 적었던 때가 20여 년 전이어서 지금(2009년) 그
액수의 돈으로는 그러한 낭만을 즐길 수 없음을 깨닫는다.
시도 인프레의 영향을 받아 세월이 지나면 의미의 퇴색을
막을 수가 없는 모양이다.
.jpg)
정류장(停留場)에서 / 임보
이른 봄
우이동 4.19탑 입구 네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쇠표 한 개를 들고
차를 기다린다.
차들은 저마다 행선지를 달고
분주히 승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어디로 갈까?
한강을 넘어 여의도쯤 건너가 볼까?
북악터널을 돌아 광화문 근처에서 내려 볼까?
아니면, 동숭동 대학로나 가서 서성거려 볼까?
까짓것 전철을 타고 교외로 빠져나가 버릴까?
그러나 쇠표는 단 하나뿐,
내렸다 다시 바꿔 탈 수는 없다.
이 도회는 어디를 가나
어두운 집들,
북적대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거기가 거기 다 마찬가지겠지만
단 하나뿐인 이 쇠표를
어느 차에 던져 넣을까 망설이다
그만 되돌아온다.
솔개 / 임보
솔개가 한 40년 살면
깃은 무거워 날개는 처지고
부리는 구부러져 가슴에 묻힌다고 한다.
그러니 높이 날기도 어렵고
사냥감을 물어뜯기도 힘들어
서서히 죽어가게 마련이다.
그런데 의지를 지닌 어떤 놈은 이때
높은 벼랑에 올라 환골탈태의 수련을 쌓는다.
제 몸의 낡은 털과 깃을 다 뽑아낸 다음
스스로 제 부리를 바위에 쪼아 부숴뜨린다.
그리고 한 반 년쯤 뜨거운 햇볕 아래
단식(斷食) 독공(篤工)의 고행을 쏟다 보면
헌 몸에 털과 깃이 새로 나고
빠진 부리의 자리에 새 부리가 돋는다.
그래서 다시 한 30년을 더 살게 된다는데
내 머리도 다 세고 이도 다 빠지고
팔다리도 힘을 잃어 휘청거리니
나도 어느 벼랑의 바윗돌 하나 얻어
한 달포쯤
헌 몸 비비고 머리도 부딪다 보면
혹 머리 다시 검어지고 이빨도 새로 돋아
흐린 눈도 맑아질는지
맑은 하늘에 높이 떠가는
한 마리 솔개를 본다.
나비 / 임보
우리집 뜰 회양목에 붙어 끈질기게 잎을 쪼아대던 배추벌레를
때려잡느라고 며칠 여름날을 설치며 보냈는데...
그리고 긴 장마가 와서 멋없이 뒹굴며 지내다가 하늘이 다시
열리던 어느 화사한 오후에 회양나무 푸른 가지 사이에서 작은
천사처럼 날아오르는 흰 나비 떼들을 문득 보았는데,
무엇이 저렇게 맑고 예쁜 영혼을 낳았나 싶어 뜰에 내려가
살폈더니, 놀랍구나, 내 눈을 피해 집을 지었던 그 징그런
배추벌레 몇 놈들이 어느덧 저렇게 곱게 우화(羽化)하여 무덤
에서 튀쳐나오듯 그렇게 천공(天空)으로 솟아오르더라.
그렇구나, 한 생애는 온 몸으로 땅을 기는 형벌의 며칠이었어도,
다른 한 생애는 날개로 천상을 나는 저렇듯 황홀한 기쁨이고나.
우리도 이 육신 다 끝나는 날, 무덤 속에서 한 보름쯤 덥히다
보면 만월 뜨는 어느 밝은 밤에 무더운 무덤을 열고 나비처럼
솟아오를 영혼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이 지상에 뿌리를 깊이 박고 떨어질세라 발버둥
치며 잎들만 열심히 쪼아대는 징그러운 배추벌레로고.

강설(降설) / 임보
용천담(龍川潭) 아래
계곡에서는
부슬부슬
내 귀로 스며
적시더니,
용천암(龍川庵) 등마루
올라서자
소복소복
내 눈을 가득 채우는
백은(白銀)
연못 아래서는
무거운 물방울이던 것이
산에 오르자
희고 흰 꽃잎들로 날리네,
마른 풀잎,
앙상한 가지마다
넘치는 황홀,
누가
저 天上의 풍속을
이토록 맑고도
차고도
풍요롭게 말하는가?

木馬日記 1 / 임보
1985년 6월 ×일
309호, <문예사조(文藝思潮)>
비어 있는 내 강의실 창가에 기대어
맵고도 더운 교정을 내려다본다.
플라타너스도 목이 타는 듯
묻힌 다리를 地上으로
地上으로 뽑아 올리는 잎새 사이로
……그 사월이 저려 온다.
1960년, 마로니에, 제9강의실, <인식론(認識論)>
우리가 아우성을 치며 강의실을 튀쳐나갈 때
열암(洌巖)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맑은 안경에 햇살이 눈부시게 어려
깊고도 날카로운 그의 눈동자를 볼 수 없었다.
그때
도망을 치자고 얻어맞은 내 팔목을 이끌던 한 친구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야채장수를 하고 있고
벗겨진 내 신발을 찾아 신겨 주던 한 친구는
아직도 가난 속에서 詩나 쓰며 그렇게 그렇게 살고 있고
깃발을 흔들며 진두에서 아우성을 치던 몇 친구들 중
누구는 오늘 입법(立法)기관에서
누구는 오늘 선고(宣告)기관에서
당당한 기성(旣成)들이 되어 목을 세우고 있다.
교정은 지금
학생들의 광호성(狂呼聲),
폭포처럼 쏟아져 내린 최루탄으로
화씨 일천 도쯤 불붙는 아수라장,
「문예사조는
고전주의(古典主義)와 낭만주의(浪漫主義)
이성(理性)과 감성(感性)의 끝없는 반복일 뿐……」
지난 주 내 강의를 듣던 학생들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가?
혹은 진두에서 아우성도 치고
혹은 뒷골목에서 막걸리도 마시고
혹은 학우의 벗겨진 신발도 주워 신기고……
이들도 한 이십 년 지나다 보면
더러는 법률도 만들고
더러는 재판도 하고
더러는 이민도 떠나고
못난 나처럼 더러는 詩도 쓰면서
그들의 아들과 딸들
새로운 세대의 표적이 되어
지금의 우리처럼 잠못드는 시대를 되풀이할 것인가?
「나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인가?」
이렇게 묻던 열암은
그의 만년에 <국민교육헌장>을 기초했다.
그리고 갔다.
그러나 무었이 달라졌는가?
산도 그대로
물도 그대로
그 사이 人間들만 번갈아 번갈아 끼울 뿐,
누군가는 민족의 백범(白凡)을 회고하고
누군가는 민주와 자유를 탓하지만
시간당 8천원짜리 시간 강사,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싸구려 얘기는
「사조(思潮)란
감성(感性)과 이성(理性)
머리와 가슴으로 엮어진 바람일 뿐……」
아무도 없는
텅빈 3층 강의실에서
매운 눈을 글썽이며
허공(虛空)을 본다.

木馬日記 2 / 임보
서가(書架)의 책갈피 위를
어디서 왔는지
한 마리
머리 고운 개미
소요하고 있다.
두 개의 촉수(觸手)를
돛으로 우뚝 세우고
그들의 동료가 아직
한 번도 가 닿지 못한 땅에
콜럼브스처럼
당당히 행군해 간다.
놈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純粹理性批判)」
그 금박활자(金箔活字)의 끝에 잠시 머물러
금분(金粉)의 향기에 젖어 있는 것인가?
문득 푸른 사색(思索).
커어튼을 들어
정오의 밝은 햇살을
그의 머리 위에 쏟자,
창 밖은
목련(木蓮) 한 송이
그 불입문자(不立文字)로
다시 다가서는
닫힘―나의 시야(視野).

목마일기 3 / 임보
웬 일인지 잠도 오지 않고,
겨울 달은 유난히 빈 나뭇가지로
얼어붙은 봉창을 자꾸만 흔들어대는
자정도 꽤 넘은 시각,
문득 청강(淸剛)의 곧은 목청이 들려온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 청강은 훼절자(毁節者)다.
일제 말 민족을 배반한 반역자로
북한산 그의 무덤은 등산객들의 발굽에
폐허가 다 되어 있다.
그런데 일전에 나는
동대문 밖 어느 고서방에서 우연히
청강의 간찰(簡札)을 하나 얻었다.
한지(韓紙)에 모필(毛筆)로 깊게 눌러 쓴
도산(島山)에게 보낸 회한(回翰)으로 보였다.
놀라운지고!
세상의 일이여!
그의 훼절은 도산의 독립작전이었던 것을
청강은 지사(志士)였던 것을
민족의 선열(先烈)이던 것을
우리는 아직 그의 진실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어찌 청강만이겠는가?
들판에 던져진 패랭이꽃 한 송이도
죽은 들풀들의 육신을 밟고 일어서거늘……
나는 요즈음 신문도 끊고
사서(史書)도 아예 덮었다.
세상은
바름과 곧음을 위해서
자신의 순결까지도 드러내 보이려 하지 않는
뜻있는 자들의 무덤을 딛고
세워졌다.
그러나
이 지상의 햇살에 빛나는 것은
탐욕(貪慾)과 술수(術數)에 영혼을 판
교만한 자들의 명패(名牌)일 뿐,
있어야 할 것들은 모두 가라앉은
비어 있는 땅
비어 있는 세상.
깊은 밤 홀로 깨어
침묵의 아우성,
청강의 목청을 듣는다.

바람과 꽃과 새 / 임보
바람은
항상 너무 넘쳐서 비어 있고
꽃은
잠시 거기만 있으므로 드러난다.
새들은
비어 있는 그 무한의 밭...
바람을 알지 못한 채
이른 봄 한 아침
향기 짙은 꽃가지에
둥우리를 튼다.
새들은
바람, 그 허공에 깃들어야 하는 것을
늦은 가을 저녁
빈 나뭇가지에서
비로소 본다.
그것도
깨어 있는 못생긴
몇 녀석들만이
그것을 본다.
그리고
바람이 되어
바람 속으로
떨어지는 꽃처럼
몸을 던진다.
墨蘭曲 / 임보
- 律 1
한 폭의 묵란(墨蘭)을 심어 보고 싶네
한 십 년쯤 짙게 먹을 갈아
황모(黃毛) 큰 붓을 창(槍)으로 곧게 세워
한산(韓山) 가는 모시 그대 치마폭에
한란(寒蘭) 아홉 꽃잎 새기고 고쳐 새겨
천년(千年) 묵은 향(香), 청산(靑山) 님의 뜻을
오월 단오(端午) 푸른 그네 바람결에
백설(白雪) 꽃잎으로 은하(銀河)토록 밀고 밀어
한(恨) 많은 풍진세상(風塵世上) 태워 보고 싶네.
宮羽圖 / 임보
- 律 2
열두 줄 가얏고 드리고 드려
헐벗은 겨울 들판 품어 보고지고
빈 몸으로 그믐토록 서서
궁우(宮羽) 미친 가락 화살을 날려
떼기러기 가슴마다 실은 상사병(相思病),
산 너머 북녘 마을 그대 창가에
산도화(山桃花) 피울음으로 심어 뒀다가
얼어붙은 님의 간장 저미고 저며
오작교(烏鵲橋) 끊긴 다리 이어 봤으면…

林步 第3詩集
木馬日記
1987년 5월 15일
東泉社 간행
책머리에
눈을 들어 市井을 보면 종일 짜증만 날 뿐이다.
마른 <목마>에 피를 담아 천리를 밟아 보고도 싶은데
몸이 쉬 따르지 못한다.
그리하여 요즈음의 내 생각은 차라리 <山中>에 가 있고,
귀는 <律>에 기울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을 다듬어 말을 줄이고 가락을 맑게 하고 싶은데
어찌 그 일이 쉬울 리 있겠는가?
옛 선비들의 욕심없는 맑고 깨끗한 詩情이 부럽기만 하다.
1987년 이른봄 저자